개인경험-역량 보다 회사 브랜드가 영업하는 시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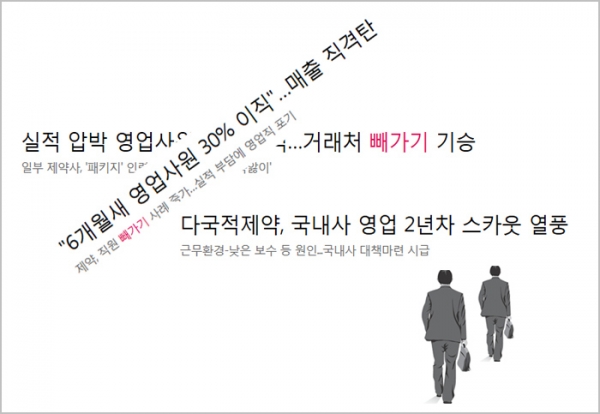
“영업사원의 개인기가 중요하던 시대에서 회사의 브랜드가 영업하는 시대로?”
제약업계에는 한 때 “영업 사관학교”라는 썩 달갑지 않은 별칭을 가진 상위권 회사들이 있었다. 신입사원을 뽑아 수 개월간 이론과 현장교육을 시키고 영업 일선에 투입하지만, 성과를 낼 만한 연차가 되면 어김없이 스카우트 대상이 되어버리는 경우가 흔하게 있었다. 당시 기사를 보면 영업사원 빼가기, 내용증명, 법적대응 등 키워드를 심심찮게 찾아볼 수 있었다.
지금은 어떨까?
“경력사원의 의미가 특별하지 않다. 예전에는 몇 명이 팀을 꾸려 회사를 이직하면 그 지역 처방이 한꺼번에 바뀌는 것도 가능했는데, 이제는 그런 일은 상상할 수 없다”고 CSO(제약회사 영업대행) 업체 운영 5년차인 전직 영업사원 K씨는 말했다.
K씨에 따르면 제약회사들의 CP(Compliance program) 운영이 어느 정도 정착되고 사정당국의 리베이트 조사도 여러 차례 제약업계를 휩쓸고 간 상황이라 의사들도 신뢰 관계가 확실하지 않으면 쉽게 받으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
그리고 회사 내에서 영업사원 개인이 활용할 수 있는 가용예산의 범위와 사용방법 역시 규정과 형식에 맞춰야 하기 때문에 개인의 유도리가 영업수단으로 쉽사리 비집고 들어갈 수 없다고 K대표는 지적했다. 따라서 “영업왕” “올해의 스타” 같은 수식어가 영업현장에서는 최근 몇 년 새 힘을 잃었다고 덧붙였다.
중견 제약회사 영업본부장 출신인 또 다른 CSO 대표 L씨는 “의사도 의사지만 환자들 눈치 보느라 영업사원이 얄미워도 약을 바로바로 바꾸지는 못한다”고 설명했다.
L씨가 목격한 실제상황을 보면 이렇다. 현금을 갖다주던 10위권 안팎의 I사 영업사원이 어느 날 의사를 찾아와 “회사에서 CP를 강조하고 선샤인 액트(Sunshine Act, 경제적 이익 등 제공 보고)도 시행되기 때문에 지금처럼 현금을 줄 수 없다”고 잘랐다는 것.
해당 의사는 L씨에게 “본인이 먼저 갖다 주다 저런 말을 하니 황당하고 얄미워 당신(L대표) 걸로 바로 바꿔주고 싶은데 요즘은 환자들이 약 바꾸면 이상하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고 하는 통에 처방을 받아내는데 까지 한참이나 걸렸다고 증언했다.
상위 제약회사에서 영업기획 업무를 하다 중소회사 영업담당 본부장으로 자리를 옮긴 C씨는 “경력사원이 팀원들을 끌고 자리를 옮긴다 해도 예전처럼 약이 한꺼번에 바뀌거나 하는 일은 생기기 힘들다”며 스타 영업사원은 없다고 단언한다.
그러면서 C씨는 이전 직장인 상위권 M사에서 의원 영업을 담당했던 임원 O씨의 사례를 예로 들었다. O씨는 직원 20명을 데리고 나와 소규모인 Y사로 이직하면서 M사의 반발과 Y사의 기대를 동시에 받았으나 M사의 처방이 흔들리거나 Y사의 실적이 상승하는 등의 성과를 내지 못했고 그를 따라 나왔던 직원들도 거의 대부분 또 다른 곳으로 이직했다는 것.
C씨는 “학회후원이나 부스참가 등 회사 차원의 공식적인 지원 범위 안에서 영업이 대개 이루어지다 보니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영업사원 개인역량과 처방의 상관관계가 예전에 비해 현저히 떨어졌다”고 밝혔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제약회사들도 경력이 오래된 영업사원들을 예전에 비해 큰 부담없이 구조조정하려는 경향도 생겨나고 있다. C씨는 “나이를 절대기준으로 구조조정하고 신입 등 새 인물을 배치하는 것에 대해 내부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컸지만 적응기를 잠깐 거친 이후부터 정작 회사 매출은 상승했다”며 “시대와 시장이 변해도 한참 변했다”고 털어놨다.
영업본부장 출신 CSO L대표는 “내가 움직이면 처방이 바뀔거라는 자신감을 가진 후배들을 종종 본다”며 “회사의 브랜드가 영업을 하는 시대로 점점 바뀌는 현실을 냉정히 생각해봐야 한다고 후배들에게 조언하고 싶다”고 강조했다.

